깐깐해진 규제당국, 투자자 압력에 '그린 프리미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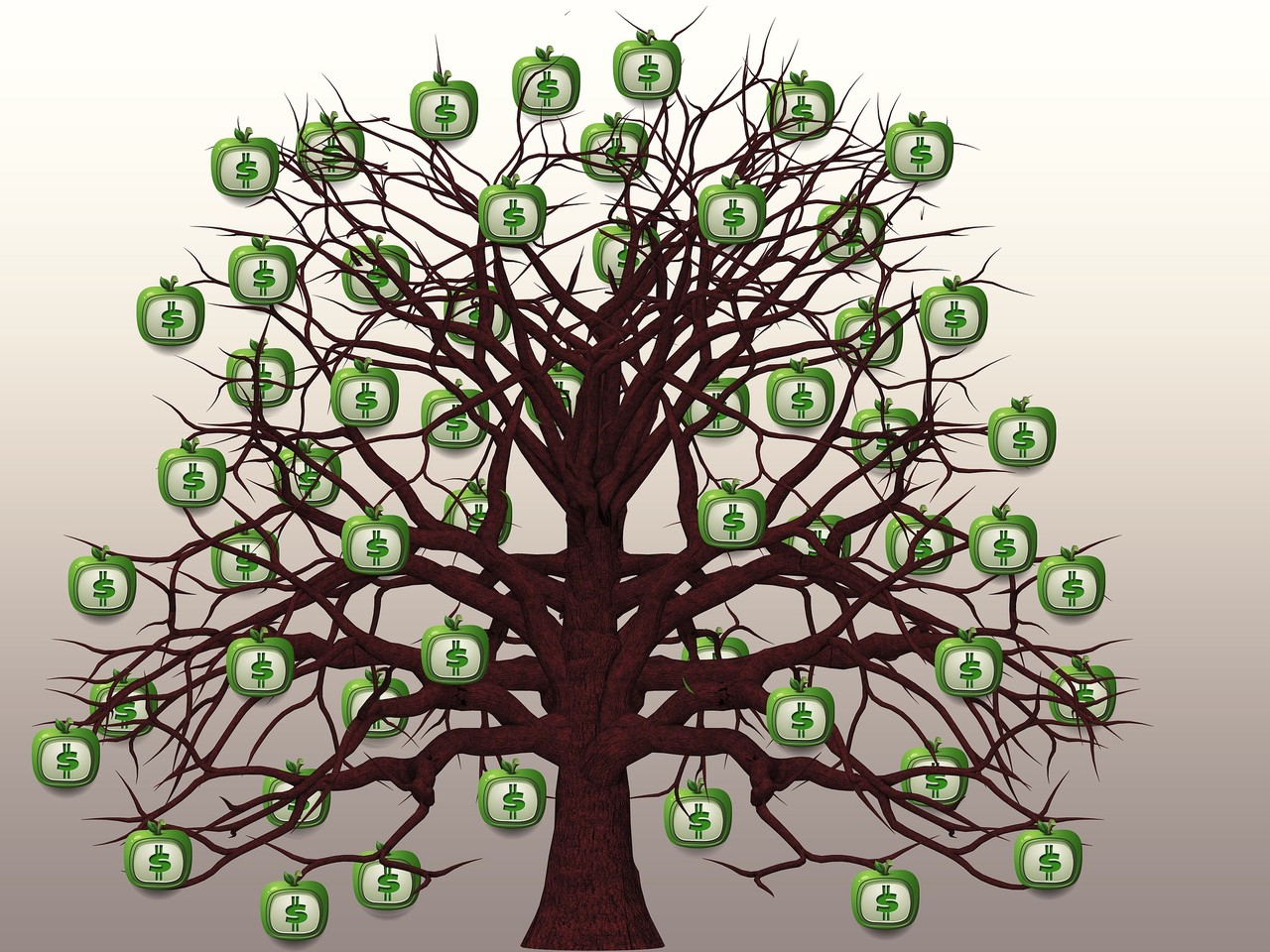
규제 강화 바람이 친환경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그린본드'(green bond)에 대한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투자부적격 기업이 발행하는 고수익·고위험 그린본드의 경우 더 그렇다고 한다.
그린본드는 일반 채권보다 가격이 높고, 수익률(금리)이 낮기 마련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줄여서 '그리니엄'(greenium)이라고 한다.
◇반토막 난 '그리미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그리니엄이 최근 들어 쪼그라들고 있다며, 세계적인 규제 바람과 깐깐해진 투자자들을 배경으로 짚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거에는 '그린본드'라는 이름만 붙으면 투자 수요가 따라왔지만, 이제는 관련 정보 공시 의무 등이 강화되고 투자자들도 기업들이 주장하는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게 됐다는 것이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시장의 거품이 해소되고 있는 셈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투기등급 고수익·고위험 그린본드가 특히 투매 표적으로 부상했다. ICE 채권지수에 따르면 고수익·고위험 그린본드와 일반 채권과의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는 9월 초 이후 0.30%포인트에서 0.17%포인트로 거의 반 토막 났다. 그리미엄이 만큼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투기등급 그린본드 수익률은 3.33%에서 3.82%로 높아졌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투자적격 등급 그린본드의 그리미엄은 0.03%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절반 수준이 됐다.
◇애매한 기준, 높아진 경계감
ESG 투자시장에는 세계적으로 수천억달러의 자금이 몰렸지만, 최근까지도 '녹색자산'의 기준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들은 명확한 투자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기업들의 주장이 믿을 만한지 따져보고 투자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도이체방크의 자산운용부문인 DWS그룹이 ESG 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와 사내 이메일에 따르면 DWS는 스스로 공표한 ESG 투자 기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자산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고 한다.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뮤지니치&코 신용포트폴리오매니저는 DWS에 대한 조사로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채권을 평가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작고 사업 정보 공개 수위가 낮기 마련인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발행한 채권에 대한 경계감이 특히 더 크다고 한다.
◇자금 유입세 둔화...유리해진 투자자
시장이 단기간에 워낙 커진 것도 문제다. 자금 유입 속도가 그린본드 발행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펀드정보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ESG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지난 1분기 1420억달러에서 2분기 950억달러로 줄었다. 이에 비해 그린본드 발행액은 각각 2990억달러, 2950억달러에 달했다.
WSJ는 그린자산을 향한 자금 유입세가 둔화하면 유리한 입장이 된 투자자들이 수익률 인상을 요구하기 쉽다고 봤다. 이같은 압력이 거세지면 자칫 녹색프로젝트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 [인사이트]금융위기 뇌관 MBS와 ESG 닮은꼴...'거품' 경고등
- [ESG]환경 보호하며 '돈'까지 버는 디카프리오의 투자 비법
- [ESG]"아이들이 무슨 죄라고"...탄소중립이 시급한 이유
- "ESG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금융권, 인력난 심각
- 4750兆 굴리는 큰손들의 압박..."亞기업 ESG 개입할 것"
- [ESG]현대엔지니어링이 '학교'를 짓는 이유
- 현대캐피탈, 홍콩채권 싱가포르에 상장…중화권 자본시장 적극 활용
-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에 걸린 아이오닉5 대형 광고
- [단독]삼성물산, 호주산 인산염 48만t 판매권 획득
- 주인도대사관·코트라, 인도 첸나이 지역 탐방…현지 진출 HDC현대EP 등 방문
- [인사이트]'가치투자의 전설' 밀러의 마지막 편지
- 이슬람채권도 'ESG' 바람..."발행액 사상 최대"
- [ESG]'그린워싱' 꼼짝마!...노르웨이 국부펀드 "'등급' 안 본다"
- [인사이트]ESG 투자붐에 청정에너지株 급락..."불확실성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