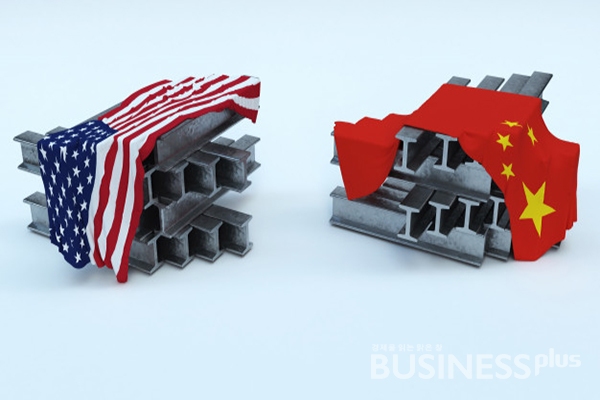
길게는 40년, 짧게 봐도 18년 이상이 된 미·중 경제의 동행이 끝날 것인가.
양국은 1979년 국교 수립으로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의 시동을 걸었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상호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왔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끊임없이 물건을 갖다 팔며 경제 발전을 이뤘다.
미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며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금융업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성공했다. 일종의 '윈윈' 전략이었던 셈이다.
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견제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에도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파국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년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당초 서구 진영에서 먼저 우려를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리샹양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 원장은 한 포럼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통상 외에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G2 경제 분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원한 바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 내 강경파가 중국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게 핵심이다.
류칭 인민대 교수는 "무역전쟁을 빌미로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급 라인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미국 기업은 물론 삼성, 소니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탈중국)'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등 중국의 대체재로 부상한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을 글로벌 왕따로 만들려는 미국의 행보에 중국 측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확산과 수출·수입선 다변화로 맞서려고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늘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관세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1.3%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 내에서도 나온다.
이는 중국의 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당장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중국 수뇌부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오죽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러 기간 중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원치 않으며 '나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을까.
조만간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된다. 중국은 관세 완전 철회와 화웨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저자세 조율 작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중국 못지 않게 우리에게도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에 원부자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든 뒤 미국에 파는 식의 밸류 체인이 망가질 수 있는 탓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변수다. 우리가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는 이유다.



